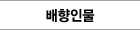 |
1)주벽-최산두(崔山斗, 1483∼?)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경앙(景仰). 호는 신재(新齋)·농중자(籠中子). 아버지는 한성판윤 한영(漢榮)이며, 어머니는 교리 한경회(韓敬澮)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을 사숙하였다.
6세 때 글을 배우러 다니다가 하루는 비를 맞고 밤길에서 도깨비를 만나 문답을 나누었는데, 도깨비가 그를 ‘사인(舍人)’이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있다. 15세 때 ≪통감강목 通鑑綱目≫ 80권을 가지고 석굴(石窟)에 들어가서 2년간 수천 번을 읽고 나오니 나뭇잎이 모두 강목의 글자로 보였다 한다. 18세에 상경하여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안국(金安國) 등과 교유하니 당시 사람들이 ‘낙중군자(洛中君子)’라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생원이 되어 25세에서 30세까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여 도덕·문장으로 이름이 나자, 김인후(金麟厚)·유희춘(柳希春) 등이 찾아와서 글을 배웠다.
1513년(중종 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14년 홍문관저작, 1516년 박사로 승진하고 이듬해 홍문관수찬·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518년 다시 수찬이 되고 보은현감이 되었다. 승정원에서 ≪성리대전 性理大全≫을 강할 사람 26인을 선발하는데 그가 첫째로 뽑혀 호당에 들어갔다. 1519년 이조정랑·장령·사인으로 승진되었으나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배되었다가 1533년 풀려나온 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문장에 뛰어나 유성춘(柳成春)·윤구(尹衢)와 함께 ‘호남삼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저서로는 ≪신재집 新齋集≫이 있다. 동복의 도원서원(道源書院)에 제향되었다.
2)박세후(朴世煦, 1493∼155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중온(仲溫), 호는 인재(認齋) 또는 눌재(訥齋). 안의(安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미창(美昌)이고, 아버지는 군자감부정 사화(士華)이며, 어머니는 신복담(辛福聃)의 딸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 11) 진사가 되고, 151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사림이 일소되자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성균관전적에 등용되고, 1522년 박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파직되었다. 1527년 다시 박사로 복직되어 전적을 지내고 사헌부감찰로 승진되었다.
이듬해 광양현감이 되어 해상의 방위에 전념하고, 공자의 묘가 허술한 것을 보고 터를 닦아 묘우를 옮겨지었다. 1533년 수부원외랑(水部員外郎)이 되고 곧 이조좌랑으로 옮겼으나, 김안로(金安老)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1535년에 공조좌랑, 이듬해 장악원첨정이 되었으나, 간관의 탄핵으로 문외출송을 당하였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홍문관교리와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거쳐 종부시(宗簿寺)와 봉상시(奉常寺)의 첨정을 지냈다. 1540년 밀양부사로 특선되어 치적을 올렸고, 1544년 좌필선(左弼善)에 이어 곧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년)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가 되고 하절사(賀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예조참의를 지내고, 1549년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관동지역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이기(李芑)의 연척인 양구현감 신난수(愼蘭秀)의 비행을 적발하여 보고하였다가 도리어 고문을 받고 왕의 특명으로 풀려났다.
|
